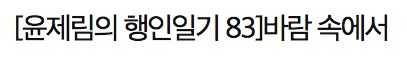오피니언 - 칼럼
2018 3월 16일
갑자기, 제주 서귀포 안덕면 ‘비오토피아’(BIOTOPIA) 생각이 났습니다. 산방산과 푸른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중산간의 명소지요.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생태공원으로서의 자부심이 무척 커 보입니다. 온천과 골프장, 호텔 등 갖가지 시설이 두루 어울렸는데 ‘수(水)풍(風)석(石) 박물관’이 볼만합니다.
‘물과 바람과 돌’의 박물관. 명칭부터 낯설지요. 언뜻 들으면, 제주의 흔한 자연물가운데 기묘한 것들을 모아 전시해놓은 공간쯤으로 짐작되기 십상입니다. 물론, 아닙니다. 물, 바람 그리고 돌을 오브제로 한 ‘건축 조형물’이라 할까요. ‘예술 건축’이라 해야 할까요. 두 가지 표현 모두 썩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결국 조금 추상적인 수사를 동원해야겠습니다. 물 박물관은 ‘하늘 사진관’이거나 ‘구름의 영화관’입니다. 원형 연못에 받아놓은 물이 거대한 거울의 역할을 하지요. 그런가하면, 돌 박물관은 ‘오픈 스튜디오’입니다. 집과 돌멩이들이 먼 풍경들과 조화를 이루며, 다양한 얘기를 만들어냅니다. 사물이 주체가 됩니다.
돌과 물은 그렇게 자연과 변주하는 그림들을 ‘만화경’처럼 보여줍니다. 박물관은 일종의 액자거나 열려진 상자입니다. 그렇다면, 바람은 어떻게 박물관에 수장(收藏)되고 전시품이 될까요. 비유컨대, 바람 박물관은 바람의 ‘호텔’이거나 ‘정거장’입니다. 잠시 쉬었다 떠나기도 하고, 하룻밤쯤 묵어가는 장소입니다.
작은 집 한 채인데, 오지랖은 ‘설문대 할망’ 치마폭처럼 넓고 큽니다. 긴 회랑을 닮은 실내가 사방으로 열려 있습니다. 판장들 틈새 하나하나가, 바람의 ‘문’이면서 ‘방’입니다. ‘통로’입니다. 당연히 서울역 철길처럼, 국제공항 활주로처럼 분주합니다. 동서남북의 바람들이 끊임없이 들고 납니다. 연방 뜨고 내립니다.
그 집에서 한 철만 보내면, 지상의 모든 바람을 다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람 박물관답습니다. 재일교포 건축가 ‘이타미 준(伊丹 潤)’의 작품이지요. 그는 제주에 부는 모든 바람결을 몸으로 느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채집과 표본, 박제까지 꿈꾸었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그것은 건축 영역 바깥의 일이었습니다.
사진은, 그 일을 합니다. 바람의 무늬까지 그림처럼 잡아냅니다. 풍향과 풍속, 경로까지를 보여줍니다. 정지화면으로 꼭 붙잡아서, 천천히 살펴볼 수 있게 합니다. 바람이 우리 곁에 와서 무슨 일을 하고 떠나는지 소상히 알게 합니다. 바람에게 무슨 일을 시키고, 무엇을 부탁해야 할 것인지 알아차리게 합니다.
저는 지금 과천에서 바람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입니다. 나라 밖에서 더 유명한 작가, ‘이정진’의 사진전입니다. ‘에코(echo)-바람으로부터’. 70여점의 작품이 아무런 프레임도 없이, 벽에 붙어있습니다. 20여년 지속해온 한지(韓紙) 작업을 대표하는 작품들이 스위스와 독일을 거쳐, 한국에 왔습니다.
한지에 감광유제를 발라 흑백사진을 프린트하는 그의 제작과정은, 수묵화의 그것을 닮았습니다. 욕심껏 넣고 채우는 일이 아니라, 대부분 비우고 버리는 작업입니다. 여백에 바람이 들어섭니다. 폐사지 칠층 전탑(塼塔)에 불던 바람이 옵니다. 미국 산타페에서 오고, 소금이 솜처럼 날리는 사막에서도 옵니다.
‘이타미 준’이 바람의 집을 지었다면, 이정진은 바람의 초상(肖像)을 그립니다. 사물과 주변풍경들로 바람의 몽타주를 만듭니다. ‘홍운탁월(烘雲托月)’! 구름을 그려 달의 얼굴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어쩌면, 그가 정말 보여주려는 것은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장면 아닐까요. 바람의 모자가 아니라 신발일지도 모릅니다.
시간이나 세월도 ‘바람의 화물이거나 이삿짐’이란 생각이 듭니다. 잔뜩 이고 지고 고단한 길을 걸어오는 바람의 짐꾼도 있겠지요. 모든 바람이 씽씽 날아다니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어느 바람은 뛰어오고, 어떤 바람은 기어서 오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귀 기울이면, 신발을 끌며 오는 바람의 가뿐 숨소리도 들립니다.
봄바람이 붑니다. 꽃바람이 입니다. 시샘의 바람도 있습니다. 뜻 없이 부는 바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 없이 스러지는 바람도 없습니다. 바람마다 태생의 사연이 있고, 살아가는 곡절이 있습니다. 어느 바람이 제 임무를 모르겠습니까. 가야할 길을 모르겠습니까. 어느 바람에게 일과 사랑이 없겠습니까.
천 년 전에 하던 장난을/바람은 아직도 하고 있다/소나무 가지에 쉴 새 없이 와서는/간지럼을 주고 있는 걸 보아라/아, 보아라 보아라/아직도 천 년 전의 되풀이다.//그러므로 지치지 말 일이다/사람아 사람아/이상한 것에까지 눈을 돌리고/탐을 내는 사람아. -박재삼, ‘천년의 바람’ 중에서
‘바람이 답을 알고 있다’는 노래가 있지요. ‘바람이 우리를 데려다 주리라’는 시도 떠오릅니다. 바람은 학교입니다. 선생님입니다.
- 시인 윤제림